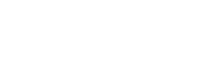서늘한 새벽이 스며들었다. 겨울로 접어든 계절의 밤은 충분히 길었고 여명이 찾아오는 길은 지난했다. 그의 생일은 늘 날선 겨울의 길목을 거닐었던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까무룩 잠들었던 서도하는 문득 한기를 느끼고 설핏 깨어났다. 겨울 공기 중에 고스란히 드러난 헐벗은 어깨가 추웠다. 반쯤 흘러내리고 또 반쯤 사라진 이불 탓이다. 사라진 이불은 제 곁에 모로 누워 잠든 사내를 돌돌 둘러싸고 있었다.
조심스레 몸을 움직여 벽에 기댄 뒤 도하는 어둑새벽 아래 희끄무레한 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실제로는 신장이 저와 그리 차이 나지 않는 윤은 이럴 때면 늘 작고 여려 보였다. 아마도 웅크린 자세 때문일까. 제 장단에 맞추느라 이른 새벽까지 시달렸던 윤은 곤히 잠들어 무슨 소리가 나도 깨지 않을 것 같았다.
여리고 어린 얼굴을 한참 동안 가늠했다. 가끔 그는 삭아버린 오랜 날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두리번거릴 때가 있었다. 내가, 그때의 내가 너를 마주 보았더라면. 그때의 내가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네가 욕심 많았더라면.
파헤칠수록 점철된 후회만 내뱉는 기억을 가로질러, 다시 서도하는 현재의 김윤을 마주했다. 그런 새벽이었다. 말없이 오랫동안 그를 보았다. 그래도 좋을, 차갑지만 외롭지 않고, 따뜻하지 않지만 선명한 온기를 붙잡은 시간이었기에.
도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침대 옆 테이블의 서랍을 열었다. 끽, 끼익, 듣기 싫은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흩어놓았지만, 괘념치 않고 반쯤 열어 조그마한 상자를 꺼냈다. 달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공단 상자가 열렸다.
시선이 다시 푹 잠들어 있는 윤에게 가닿았다.
잠시 입술을 깨문 서도하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이불 속에 파묻힌 윤의 왼손을 찾았다. 제가 아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안심시키는 온기가 그곳에 있었다.
반지는 심플했다. 화려한 보석 장식은 없지만, 무한을 의미하는 완전한 원형의 일반적인 반지와 달리 한쪽 끝이 다른 끝을 덮은 디자인은 서도하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영원을 믿지 않는 제 나약함을. 하지만 언제고, 어떤 일이 오더라도 붙잡을 제 탐욕을. 그리고, 전부. 서도하가 김윤에게 원하는 질량, 그리고 그가 김윤에게 줄 수 있는 질량인 전부를.
“김윤.”
도하는 나직하게 이름을 불러보았다. 창 너머 한 귀퉁이가 소리 없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심장이 내뱉는 벅찬 생명의 흐름 같았다. 창밖의 동터 오는 하늘을 힐끗 쳐다본 도하는 여전히 곤히 잠든 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틈새로 간신히 들어온 햇살이 윤의 얼굴을 스친다. 다정한 햇살을 닮은 다정한 온기.
도하는 여전히 제 손아귀에 쥔 남자의 고운 손을 굳게, 오랫동안 꼭 잡았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윤아, 내가 널 정말로 많이 좋아해.”
줄 것이라고는 진심밖에 없는 내가, 너에게 간신히 건네는 보잘것없는 고백.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를 맞이할 풍경이 무척이나 기다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