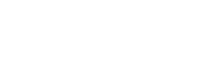윤은 그대로 몸을 돌려 다급하게 가게를 빠져나왔다. 텅! 묵직한 출입문이 거칠게 열렸다 닫히는 소리를 등 뒤로 하며 거침없이 걸었다. 기어이 툭툭 떨어진 눈물이 줄줄 흘렀다.
바보처럼 엉엉 울었다.
너는 왜 그렇게 멀쩡한 건데. 나는 하나도 멀쩡하지 않은데. 그럴 거면 차라리 행복한 얼굴이라도 보여주지, 너는 왜 여전히 외로워 보이는데.
서도하가 여전히 멋지고 외로워 보여서,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었다. 자신을 버리고서도 아프지 않아 보여서 억울했다. 아무래도 깨닫지 못한 취기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다. 이렇게 널 다시 볼 줄 몰랐는데, 괜히 봤다고, 저를 데려간 재훈을 욕했다. 아직 떠나지 못한 겨울의 잔재가 밤의 어둠 속에서 윤의 머리 위를 맴돌았다.
부옇게 변한 시야를 닦아내지 못하고 한참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그저 걸었다. 누군가 윤의 어깨를 잡아채기 전까지, 윤은 계속 그렇게 울면서 걸었다.
“…김윤! 미쳤어?”
불 켠 택시 한 대가 거칠게 경적을 울리며 윤의 곁을 스치고 지나쳤다.
윤은 눈을 깜빡여 간신히 눈물을 떨구고 초점을 맞추려 안간힘을 썼다. 잔뜩 화가 난 표정을 한 서도하가 그를 억세게 붙잡고 있었다.
“…네가 왜 왔어?”
“너 돌았냐고, 김윤! 집에나 들어가지 왜 차도를 걸어!”
그제야 윤은 얼굴을 찡그린 채 고개를 돌려 주변을 쳐다보았다. 한 걸음 내디디면 차들이 쌩쌩 달리는 2차선 도로였다. 얼굴을 세게 문질렀다. 얼마나 걸은 건지 모르지만, 그사이 차갑게 식은 피부 위로 옷깃이 스칠 때마다 뜨겁게 열이 올랐다. 분노와 원망을 닮은 열이었다.
“왜 찾아왔어? 내 이름은 왜 불러.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잡아?”
서도하의 입술이 부르는 제 이름은 마치 꿈처럼 희미하고 또 또렷해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졌다. 두 달 내내 꿈을 꾸고 일어나면 북받쳐 흘렀던 감정만큼, 억울함이 번졌다. 오랫동안 그를 집어삼키던 불안과 분노,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윤이 주먹을 쥐고 서도하의 어깨를 쳤다. 몸을 흔들며 서도하의 어깨를 치고 가슴을 치고 팔을 치다가 끝내 입술을 깨물고 엉엉 울었다.
“넌, 나한테 왜 그래? 도하야, 너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소년이었던 서도하는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그림 같았는데, 겨우 두 달 만난 서도하는 가끔은 다정하고 대체로 저속하고, 윤을 괴롭게 했다. 여전히 고독하고 혼자여도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처럼 자신을 쥐고 흔들었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좋아했는데, 너는 그게 싫으면서 왜 흔들어, 도하야, 대체 왜 그래?”
윤은 이제 정말로 관두고 싶었다. 그를 좋아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말해서 서도하를 괴롭힐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전부 관두고 싶었다. 그래서 관뒀다. 서도하를 보지 않으면 다시 예전처럼 기억 속의 그를 더듬으면 되니까.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면 되니까. 그걸로도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서도하는 그것마저 하지 못하게 저를 붙잡았다. 그래서 억울했다. 분하고 서러워서 윤은 씨근거리며 숨을 들이켰다. 두서없이 토해내는 윤의 감정을 서도하는 한참이나 묵묵히 듣고 있었다.
간신히 가라앉은 가슴을 움켜쥐며 윤이 고개를 들었다가, 숨을 다급하게 들이켰다. 언제부터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걸까.
서도하가 분하고, 억울하고, 볼썽사나운 얼굴로 윤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는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었을까. 달아올랐던 뺨이 식을 만큼의 시간이 지난 뒤 도하가 입을 열어 윤에게 물었다.
“그러는 넌 뭔데. 너도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 없잖아. 좋아한다는 얼굴 하고서, 눈치 보면서, 한 번도 나한테 말한 적 있어? 김윤, 너는 그런 적 있느냐고.”
“그, 건… 네가 싫어….”
“내가 싫어했다고? 내 탓이라고? 맞아. 나는 남들이나 좋아하는 거 싫어.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 이용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그런 쓰레기야. 그래도 나도 인간이야.”
서도하가 괴로운 얼굴로 윤에게 말했다.
“넌 물어본 적 있어?”
윤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뭘?
“…내가 널 좋아하느냐고, 널 좋아해 줄 수 있느냐고 넌, 한 번도 안 물었잖아. 너도 내게 제대로 말해주지도 않고, 확인하려 들지도 않았잖아.”
꺼질듯한 목소리가 괴로움을 누르며 윤에게 물었다. 윤을 탓했다. 김윤은 다시금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서도하가 자신 때문에 괴로워 보여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내가 널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마치 고백 같아서. 도하의 파리한 말은 쉽사리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았다.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며 마음으로 곱씹다가, 기어이 그 말이 심장에 다다른 뒤에야, 윤은 무너지듯 주저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