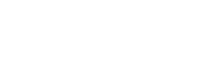ⓒ 2022. GGOM (Twitter @ggom_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감정의 자각은 찰나였다.
그때 너를 떠올리면, 나는 너를 뭐라고 규정지어야 할까.
소문 탓에 학우들과 도무지 섞이지 못하던 너는, 언제나 날카롭게 날 서 있는 게 당연하고 어울렸지. 아직 어리고 유약했던 우리를, 그때의 너를 흔드는 것은 너무도 많았을 거야, 도하야.
그러나, 그런 네 다정함이, 수없이 상처받으며 단단하게 싸맨 마음 틈으로 스며 나오던 네 다정함이 오랫동안 나에게 그 시절의 너를 잡아두었다. 계산하지 않고 다정하지 않았던 네 다정함이 말이야.
김윤은 그와 처음으로 말을 나누었던 날을 떠올렸다.
기억 속의 소년은 여느 때처럼 운동장에 있었다. 경기가 있으나 없으나, 서도하는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 연습했다. 그 날도 그런 날이었다.
윤은 환절기의 지독한 감기가 찾아와 비실비실 앓다 기어이 조퇴하던 중이었다. 초봄의 꽃샘추위는 지독했고, 주변에서 쏟아내는 기대감은 그를 짓눌러 움츠러들게 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밭은기침이 치밀어 올랐다.
느린 걸음으로 넓은 운동장을 빙 둘러 반쯤 지나쳤을 무렵, 문득 눈에 들어온 뒷모습에 윤이 저도 모르게 우뚝 멈춰 섰다. 잠시 쉬던 참인지 서도하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이온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윤은 다시금 치밀어오르는 기침을 애써 누르며 한참이나 서 있었다. 그냥 그랬다. 여전히 일몰이 빠른 초봄의 하늘은 조금씩 한 구석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아직 생기를 되찾지 못한 잔디가 진한 오렌지빛으로 물들었다. 그 가운데에 땀에 전 서도하가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목을 젖혔다. 음료수가 넘어갈 때마다 도드라진 목울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며 윤은 관능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느꼈다.
낯선 감정을 깨닫는 순간 참았던 잔기침이 터져 나왔다.
이윽고 서도하가 뒤를 돌아봤다.
‘…먹고 싶어? 줘?’
누가 봐도 이상했을 모습이었는데 서도하는 놀라지 않았다. ‘거기서 뭐 하느냐’라던가, ‘뭐냐’라던가, 혹은 ‘누구냐’라던가. 무표정한 표정을 띄운 곱상한 얼굴이 불시에 말을 꺼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김윤은 대답하는 것도 잊고 그런 서도하의 얼굴을 멍청하게 쳐다봤다. 소년의 보폭으로 서너 걸음.
이렇게 가까이에서 서도하를 본 것은 그때만 해도 처음이었다. 간혹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운동장 위 서도하를 눈에 담는 게 전부였던 김윤에게 전혀 반갑지 않은 일이었다.
목소리를 들은 것도 처음이었다. 경기 중 콜사인을 하느라 목이 터져라 외칠 때만 간혹 들었을 뿐이던 서도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부드럽고, 동요하지 않았다.
< 저 새끼, 남자랑은 말도 안 섞는다던데. 아예 없는 취급 한다잖아. >
김윤은 문득 소년들이 떠들어대던 말 중 한 토막이 떠올랐다. 실제로도 서도하는 대부분 혼자 있었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고 유일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대상이라고는 중학교에서 같이 올라온 김재훈이라는 친구뿐이었다.
그래서 낯설었다. 김윤은 적절하게 대답해야 한다는 것도 잊고 서도하를 한참이나 쳐다보았다. 마치 조용하고 오래된 미술관 한구석에 자리한 명화를 감상하듯.
서도하는 특유의 무심하고 서늘한 표정으로 김윤을 힐끗 쳐다보고 말았다. 떨어진 서너 걸음. 그 자리에 못 박혀 선 채 김윤은 겨우 그 정도 되는 걸음을 좁히지 못했다. 아마도, 분명, 제 표정에선 이미 멍청함이 줄줄 흘러나왔을 것이다.
쿨럭쿨럭. 김윤의 입에서 내도록 이어져 온 잔기침이 이번엔 폐를 쏟아낼 것처럼 격렬하게 튀어나왔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